- 사이렌의 노래
- 박태범 라자로 신부
- 사람은 의외로 멋지다
- 그녀, 가로지르다
- 영화, 그 일상의 향기속으로..
- 사랑이 깊어가는 저녁에
- 어느 가톨릭 수도자의 좌충우돌 세상사는 이야기
- 테씨's Journey Home
- 성서 백주간
- El Peregrino Gregorio
- KEEP CALM AND CARRY ON
- HappyAllyson.Com 해피앨리슨 닷컴
- words can hurt you
- 삶과 신앙 이야기.
- Another Angle
- The Lectionary Comic
- 文과 字의 집
- 피앗방
- 여강여호의 책이 있는 풍경
- 홍's 도서 리뷰 : 도서관을 통째로. : 네이버 블로…
- 행간을 노닐다
- 글쓰는 도넛
- 명작의 재구성
- 사랑과 생명의 인문학
- 자유인의 서재
- 창비주간논평
- forest of book
- 읽Go 듣Go 달린다
- 소설리스트를 위한 댓글
- 파란여우의 뻥 Magazine
- 리드미
- 여우비가 내리는 숲
- 인물과사상 공식블로그
- 개츠비의 독서일기 2.0
- 로쟈의 저공비행 (로쟈 서재)
- 세상에서 가장 먼 길,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 2.…
- YES
- Down to earth angel
- BeGray: Radical, Practical, an…
- newspeppermint
- 켈리의 Listening & Pronunciation …
- Frank's Blog
- 클라라
- Charles Seo | 찰스의 영어연구소 아카이브
- 영어 너 도대체 모니?
- 햇살가득
- 수능영어공부
- 라쿤잉글리시 RaccoonEnglish
- Daily ESL
- 뿌와쨔쨔의 영어이야기
- 교회 음악 알아가기
- 고대그리스어(헬라어)학습
깊이에의 강요
다정소감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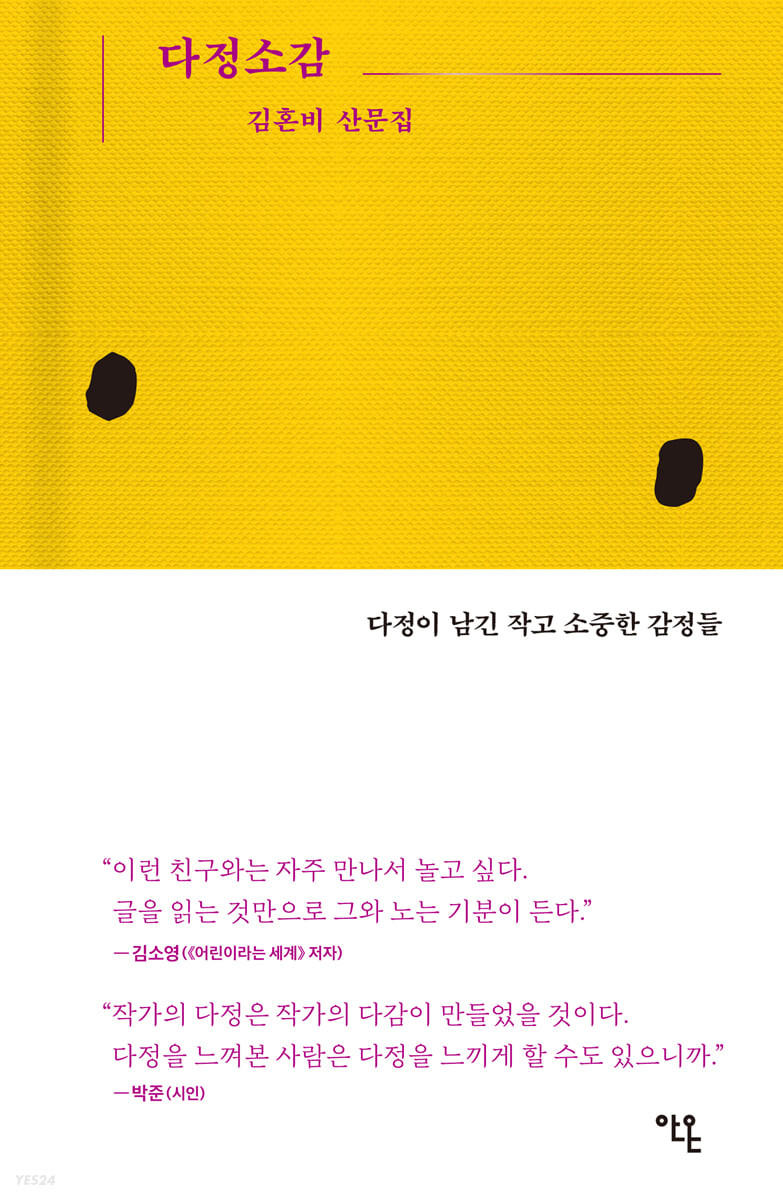
김혼비 산문집. 안온.
우리들이 이만큼만 생각하고 표현하며 살 줄만 알아도 세상이 지금보다 몇 배는 '살고 싶은' 세상이 될텐데 싶었다. 내가 평소에 잘 쓰는 말로 표현해 보자면, '훌륭한' 책이었다. 그의 글 모두가 좋았지만 특히 '가식에 관하여'를 읽을 때 제일 많이 공감했다. 평소에 나는 작가가 말하는 가식을 '가면'이라고 표현하곤 하는데, 그래, 적당히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을 닮으려 애써가며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수행'이 아니겠나 생각한다.
갑자기 너무나 읽고 싶어서(실은 오디오북으로 듣고 싶었던 책인데...) 결국 ebook으로 호다닥 이틀 만에 다 읽어버렸다. 이 훌륭한 책, 나만 보기 아까우니 모두 함께 보자!
"‘결정 장애’처럼, 무언가를 잘 못 정하는 상황, 어떤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장애’라는 단어를 빗댐으로써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쓰지 않는다. 질병을 희화화하는 표현인 ‘발암 축구’ ‘암 걸리겠다’ 같은 말도 쓰지 않는다."
"왜 항상 당연하다는 듯 데리러 가지 못하는 주체로 ‘엄마’가 상정되는 거지? 마치 비 오는 날 아이를 학교에 데리러 가야 하는 건 오직 엄마들만의 몫이라는 듯. 남겨진 아이의 슬픔은 오직 엄마의 잘못이라는 듯."
"어떤 사람들은 ‘솔직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솔직한 나’에 대해 너무나 비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으니, 아무 노력 없이 손쉽게 딸 수 있는 타이틀이 ‘솔직한 나’여서 그런 것일까. 앞으로도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싶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싶은데 이걸 그럴듯하게 포장해줄 타이틀이 ‘솔직한 나’ 밖에 없어서 그런 것일까"
"어떤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하는 표현의 지저분함이 있다. 나에게는 ‘남녀노소’도 그런 경우이다. ‘남녀노소’라고 쓰면 깔끔하고 편하겠지만, 거의 모든 저런 형식의 단어 조합에서 남자가 늘 맨 앞에 오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지겹게 느껴져서 그 이후로는 굳이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과 남성들’이라고 풀어서 쓰고 있다. 굵게 쓴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런 이유에서 ‘조부모’ 대신 쓴 것이다. 이미 수많은 글과 말에서 남자가 여자에 앞서 호명되어왔으니(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테니) 반대의 경우도 많이 만들어내고 싶다."
"주변에는 그 누구의 충고도 필요 없이, 자기 소신껏, 길을 잃지 않고 (혹은 길을 잃더라도)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잘 끌고 나가는 주체적이고 현명한 사람들도 많다. 반면에 기분을 거스르는 말(“충고는 더 기분 나쁘다”는 초등학생의 통찰을 상기해보자)에 귀를 꽉 막은 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만 곁을 채우며 살다 견고해진 아집과 함께 훌쩍 꼰대가 되어버린 사람들 또한 있다. 나도 당연히 전자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언젠가부터 소위 말하는 ‘솔직함’이라는 것들에 지쳤다. 솔직함은 멋진 미덕이고, 나 역시 각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실하려고 노력하며,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곤 하지만, 솔직함을 무기 삼아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이들을 볼 때마다 일종의 환멸 같은 게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 "
"‘급식충’ ‘설명충’처럼 사람을 곤충에 비교하며 사람과 곤충 모두에게 실례를 범하고 있는 ‘-충’이라는 말도 쓰지 않는다. ‘고아가 된 기분이다’와 비슷한 이유에서 ‘거지 같다’는 말도 쓰지 않는다. ‘유모차’ 대신에 ‘유아차’를, ‘낙태’ 대신에 임신 주체인 여성의 결정권을 우선한 표현인 ‘임신 중단’ 혹은 ‘임신 중지’를 쓴다. 그 누구도 단어에 갇히고 말에 상처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선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설령 안다 한들 그것을 위조라도 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고(그렇다. 선을 위조하는 데에는 큰 노력이 필요하다), 아무런 포장 없이 자신의 마음 밑바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솔직함의 미덕이라고 여기는 사람과는 일단 말부터가 통하지 않았다. 서로 윤리관이 전혀 달랐다. 그런 부류의 사람을 볼 때마다 가끔 나는 ‘위악’이라는 말이야말로 위선적으로 느껴지곤 했는데, 어떤 의도에서든 바깥으로 방출하는 행동이 ‘악’이라면 그건 그냥 ‘악’일 뿐인 것을, ‘위악’이라는 말 뒤로 숨는 것 같기 때문이다. "
"남에게 충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꼰대가 아니라고 믿지만, 남의 충고를 듣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꼰대가 되어가는 걸 모르고 사는 것. 이게 가장 두렵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그의 눈빛이었다. 그는 늘 나를 세상 쓸모없고 성가신 사람 보듯 바라봤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눈빛들은 차곡차곡 내 눈 안으로도 들어와서 언젠가부터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때 알았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성가시고 하찮은 존재’로 매일매일 규정되다 보면,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라는 글자는 슬며시 사라지고 그저 ‘성가시고 하찮은 존재’로서의 나만 남는다는 것을. 나에게조차 나는 성가시고 하찮았다. 그렇게 하찮을 수가 없었다."
"장애인 비하가 들어가 있는 표현들, 이를테면 ‘꿀 먹은 벙어리’ ‘눈뜬 장님’ ‘눈먼 돈’ ‘앉은뱅이책상’ ‘절름발이 행정’ 같은 말도 역시 쓰지 않는다."
"나는 나에게 타인의 충고나 조언, 쓴소리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낀다. 들어두면 도움이 될지 모를 빛나는 충고들이 꼰대질과 한데 묶여 버려지는 것이 못내 아쉽다. ‘충고는 하지도 듣지도 말자’가 대세가 되어가는 분위기를 마주할 때마다 작전 실패의 경험이 떠오르며 조바심 나기도 한다. 그때처럼 결국 분위기 파악 못 하는, 할 생각도 없는 진성 꼰대들만 남고, 말 한마디에 신중하고 지각 있는 사람들의 충고는 점점 듣기 어려워지면 어쩌지?"
"지식의 양과 지식을 지혜로 응용하는 능력은 엄연히 다르고, 아는 것이 많은 것과 제대로 아는 것,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역시 전혀 다르다. 맞춤법을 잘 지키는 일이 말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활자’에 익숙하다는 것, 활자의 대한 감각이 있고, 활자 소통력이 높다는 것 정도가 아닐까. 맞춤법이 갖는 위상은 거기까지가 적당한 것 같다."
'雜食性 人間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0) | 2022.04.30 |
|---|---|
|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 (0) | 2022.04.29 |
|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 (0) | 2022.04.22 |
| 사랑의 기쁨 (0) | 2022.04.19 |
| 대도시의 사랑법 (0) | 2022.04.17 |




